
고려대 유승호 교수팀, 알루미늄 이온 도핑을 통한 선택적 산소 산화반응 이용경희대 연구팀과 공동 연구, 성능 개선된 나트륨 이온 전지 양극 소재 개발 고려대학교(총장 정진택) 공과대학 화공생명공학과 유승호 교수 연구팀(제1저자: 윤건희 석사과정 1년차)이 경희대 기계공학과 김두호 교수팀(제1저자: 구소정 석사과정 2년차)과 공동 연구로 현재 고착되어있는 나트륨 이차전지 양극재에서의 산소(음이온) 산화반응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그 원인에 대해 규명했다. 이를 통해 향후 산소 산화환원 반응을 고려한 나트륨 이차전지 양극재의 설계에 대한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다. - 논문명 : Enabling Stable and Nonhysteretic Oxygen Redox Capacity in Li-Excess Na Layered Oxides- 저자 : Geon-Hee Yoon, Sojung Koo, Sung-Joon Park, Jaewoon Lee, Chanwoo Koo, Seok Hyun Song, Tae-Yeol Jeon, Hyungsub Kim, Jong-Seong Bae, Wonjin Moon, Sung-Pyo Cho, Duho Kim, and 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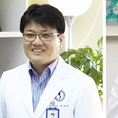
아주대 의대 박태준 · 강희영 교수팀세놀리틱(senolytic drug) 약물 ‘ABT263’ 이용, 미백효과 확인'The potential skin-lightening candidate, senolytic drug ABT263, for photoageing pigmentation' 자외선에 의한 광노화로 인해 색소 침착된 피부에서 노화세포 제거를 통해 미백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아주대 의대 생화학교실 박태준 교수(박지희 연구원)와 피부과 강희영 교수는 광노화로 인해 색소가 침착된 피부에 노화세포만 선별적으로 없애는 세놀리틱(senolytic drug) 약물인 ABT263을 이용해 피부 미백효과를 얻을 수 있음을 세계 최초로 확인했다. 노화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이를 늦추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해오고 있다. 피부노화가 진행되면 진피조직의 섬유아세포(콜라겐을 만드는 세포)가 노화과정에 들어가며, 이렇게 노화된 세포는 진피조직에 계속 쌓인다. 노화가 시작된 섬유아세포는 SASPs(senescence-associated secretory phenotypes)란 물질을 분비해 피부색소 침착, 피부기능 저하를 일으킨다.

위암 피하고 싶다면 꾸준히 비만 관리해야 - 비지속적 비만인 경우보다도 8% 높아 비만이 계속되면 위암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위암 예방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비만관리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의 위암 발병률은 세계 최고로, 위암의 위험인자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인자 중 하나인 비만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일관되지 못한 결과를 보였다. 특히 기존의 비만 연구는 특정 시점에서의 비만과 위암의 연관성을 확인한 것이 대부분이다.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 소화기내과 임주현 교수,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신철민 교수, 숭실대학교 한경도 교수 공동연구팀(사진1)은 지속적 비만이 위암의 발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했다. 연구팀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연속 5년 동안 국가건강검진에 참여한 수검자 중 위암 진단 이력이 없는 성인 약 275만 명을 대상으로 비만도와 위암 발생 여부를 평균 6.78년 동안 추적 관찰했다. 그 결과 총 13,441명에서 위암이 발생했다. 연구팀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비만 기준인 체질량지수(25kg/m)와 허리둘레(남자 90cm, 여자 85cm)로 비만을 정의하고 5년 동안 계속

- 서울성모병원 피부과 이지현 교수팀, 대사증후군과 건선 연관성 연구 - 건보공단 빅데이터 564만여명 대상 4년간 추적 관찰, 분석 연구 - 대사증후군 4년간 지속진단되면 없는 경우보다 건선 위험 1.11배 증가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피부과 이지현 교수(교신저자), 여의도성모병원 피부과 이현지 임상강사(제1저자) 연구팀이 대사증후군과 건선 발병 위험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대사증후군이 없다가 생겼거나, 지속적으로 있는 경우 건선 발병 위험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바탕으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건강검진을 받은 성인 564만4,324명을 네 그룹으로 나눠 분석했다. 네 그룹은 대사증후군 없는 그룹(343만9,976명), 대사증후군 선진단 그룹(2009년 진단, 2012년 비진단, 43만44명), 대사증후군 후진단 그룹(2009년 미진단, 2012년 진단, 75만2,360명), 대사증후군 지속진단 그룹(2009~2012년 진단, 102만1,944명) 등이다. 연구 결과, 대사증후군 없는 그룹에 비해 대사증후군 후진단 그룹은 건선 발병 위험도가 1.08배 높았으며, 대사증후군 지속진단 그룹은 1.11배 증가하

고려대 안암병원 강성구 교수, 로봇 전립선 암 수술로 수술 이후 성기능 회복률 향상 가능- 전립선암 로봇 수술의 세계적인 권위자 Vipul Patel 교수와 함께 ‘역행성 조기 신경혈관다발 보존술’ 국내 소개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비뇨의학과 강성구 교수가 전립선 암 수술 후 성기능 저하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역행성 조기 신경혈관다발 보존술’을 국내학회에 소개하며 국내 로봇수술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있다. 강 교수는 전립선암 로봇 수술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Vipul Patel 교수와 함께 역행성 조기 신경혈관다발 보존술 (이하 Toggling technique)이 발기기능 회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대한의학회지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 최신호에 게재했다. 연구결과 강 교수의 역행성 조기 신경혈관다발 보존술은 기존 전립선 암 수술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대표적인 합병증 중 하나인 발기 기능 저하를 크게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역행성 조기 신경혈관다발 보존술을 이용하여 수술을 받은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10%이상 더 나은 발기기능 회복 추세가 확인되었으며, 로봇 전립선 암 수술 후 1년이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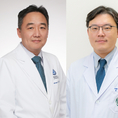
세브란스 김승업 교수, 이대서울병원 이민종‧전호수 교수 연구결과 미국소화기학회저널에 11,690명 비알코올성 지방간질환 환자 대상 연구발표 “고위험군에서 운동의 위험도 감소 효과 커” 비알코올성 지방간질환 환자에서 운동(physical activity)은 간섬유화, 근감소증과 함께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 감소와 유의미한 연관성 있으며, 운동량이 커질수록 이러한 효과가 크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신촌 세브란스 병원 김승업 교수와 이대서울병원 이민종‧전호수 소화기내과 교수는 2월 4일 소화기내과 분야 유명 학술지 중에 하나인 Clinical Gastroenterology and Hepatology (IF 11.382) 온라인판 최근호에 비알코올성 지방간질환 환자에서 운동량의 증가가 간섬유화, 근감소증, 심혈관질환의 위험도 감소와 유의미한 연관성이 있고, 고위험군일수록 이러한 위험도 감소의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연구팀은 지난 2014년부터 2020년 동안 이대서울병원과 이대목동병원, 그리고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건강검진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신체활동 평가를 받은 1만1,690명의 비알코올성 지방간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운동량에 따른 간섬유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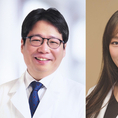
- 서울대병원, 방사선색전술 치료효과 입증...부작용↓ 입원기간↓- 기저질환으로 수술 어려운 환자에게 대체치료법으로 활용 기대 5cm 이상 크기가 큰 단일결절 간암에서 경동맥 방사선색전술의 치료효과와 부작용을 분석한 연구결과가 나왔다. 간암치료의 표준으로 인정받는 간절제 수술과 치료효과는 비슷한 반면, 부작용은 방사선색전술이 더 적은 것으로 밝혀졌다. 향후 수술이 어려운 환자에게 효과적이고 안전한 치료대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간암은 국내에서 7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암이다.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2019년 간암 신규 환자는 1만5605명으로 전체 암발생률 중 6.1%를 차지했다. 간암 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은 37.7%로 전체 암 생존율 70.7%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간암 환자 3명 중 2명은 5년 안에 사망한다. 그중 5cm 이상 크기가 큰 간암은 특히 예후가 나쁘다. 표준 치료법으로 알려진 간절제 수술을 받더라도 2년 내 약 30%의 환자에서 재발한다. 또한, 수술 후 간의 크기가 줄어들어 간 기능이 저하될 위험도 크다. 이 때문에 기저질환 등으로 간절제 수술이 어려운 환자의 대체치료로서 주로 ‘경동맥 화학색전술’이 이뤄졌다. 이 치료법은 암의 크

고대 유승호 교수팀, 서울대-서강대 연구팀과의 공동 연구로 고성능 리튬-황 이차전지 개발 촉매의 원자단위 조절을 통한 차세대 리튬-황 전지 성능향상 고려대학교(총장 정진택) 화공생명공학과 유승호 교수 연구팀 (제1저자: 김성준 박사)이 기초과학연구원(IBS) 나노입자연구단장을 맡고 있는 현택환(공동교신저자, 서울대) 교수팀, IBS 나노입자연구단 부단장을 맡고 있는 성영은(공동교신저자, 서울대) 교수팀, 백서인 (공동교신저자, 서강대) 교수팀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그래핀 지지체의 형상 변화를 통해 철 단원자 전기촉매의 원자구조를 성공적으로 변경하고 리튬-황 전지의 산화환원 전환 반응을 촉진하여 리튬-황 전지의 전기화학적 성능을 크게 향상시켰다. 연구 성과는 국제 저명 학술지 ‘어드밴스드 펑셔널 머터리얼즈 (Advanced Functional Materials)’ (IF=18.808)에 유럽 현지시간 1월 26일 게재됐다. 현재 상용화되어 있는 리튬 이온 이차전지는 리튬이나 코발트 등 값비싼 재료를 사용하여 제조 단가가 높고, 에너지밀도가 낮아서 대용량 전지를 위한 새로운 고용량의 전극 소재의 개발이 요구된다. 황은 기존의 리튬 이온 전지 양극 소재의 5배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