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이화학연구소(RIKEN)는 피부감각을 지각하는 뇌의 신경회로 메커니즘을 해명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우리는 오감을 통해 주변의 세계를 지각한다. 오감 중에서도 피부감각(촉각)은 유일하게 자신과 상대방이 직접 혹은 상호간에 영향을 미치는 감각이다. 눈(시각), 귀(청각), 코(후각), 혀(미각)의 정보는 몸의 국소 부위의 정보인 반면, 피부 감각은 전신에서 얻을 수 있다. 물질을 만질 때 얻을 수 있는 피부감각 정보는 척추나 시상을 경유하여 대뇌 신피질의 제1 체성감각영역(primary somatosensory area, S1)에 도달한다는 사실이 해부학 및 생리학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S1에 도달한 정보는 보다 고차의 뇌 영역에 전달된다. 이처럼 저차 영역에서 고차 영역으로의 입력을 ‘상향식(bottom-up) 입력’이라고 부르며, 특히 피부의 감각기에서 일어나는 외계입력을 외인성 상향식 입력이라고 부른다. 반면, 고차 영역에서 저차 영역으로 입력하는 것을 ‘하향식(Top-down) 입력’이라고 부른다.
지각에 관련된 종래의 가설은 피부감각의 자각에는 피부의 외부성 상향성 입력과 별도의 주의 및 예측에 관련되 뇌내 활동에 의한 내인성 하향식 입력이 관여된다고 설명하였다. 외인성 상향식 입력과 내인성 하향식 입력이 뇌의 어느 영역에서 연합하는 것으로 피부감각을 지각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만약에 이 가설이 타당하다면 우리는 ‘무언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느낄 수 없는’ 것이 된다. 하지만 실제 우리들은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멍하니 있는 상태에서도 피부 감각을 느끼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종래의 가설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설명할 수는 없었다. 이처럼 지금까지는 피부 감각의 지각을 형성하기 위한 기본 신경회로와 그 메커니즘은 알려져 있지 않았다.
이에 연구진은 마우스를 이용하여 피부감각을 지각하는 뇌 내 메커니즘을 단일 신경세포 레벨에서 회로 레벨까지 포괄적으로 조사하였다.
연구진은 마우스의 피부감각의 지각을 보이는 신경회로를 찾기 위해 신경활동에 광범위하게 다다르는 막전위 이미징을 대뇌신피질에 수행하였다. 마우스의 뒷다리를 자극하면, 우선 뒷다리에 대응하는 S1의 영역이 활성화된 후, 제2운동영역(M2)이 활성화되었다. 다음으로 신경활동을 억제하는 약을 S1 또는 M2에 각각 투여하여 그 효과를 관찰하였다. 그 결과 S1을 억제한 경우에는 M2의 활동이, M2를 억제한 경우에는 S1의 늦은 활동(지발성 신경활동)이 억제되었다. 이 결과를 통해 뒷다리의 정보가 S1 -> M2 -> S1로 흐른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는 피부감각이 외인성 상향식에서 S1에서 고차 뇌영역인 M2로 보내진 후, 다시 S1로 ‘외인성 하향식 입력’으로 피드백하는 반영회로가 존재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림 2] S1와 M2에서의 마우스 뒷다리 자극시의 신경활동](//www.mdon.co.kr/data/photos/20150522/art_1432809507.jpg)
다음으로 반향회로에서 신경활동을 상세하게 조사하기 위해 실리콘 전극을 이용한 활동전위의 응답을 측정하였다. ([그림 2A]) 대뇌 신피질 층 구조를 구분해보면 각각 층은 다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우선 S1의 신경활동은 피질의 전 1-6층에 기록되며, 전체 층에서 조발성 신경활동과 지발성 신경활동의 두 가지 피크를 기록하였다. ([그림 2B]) 한편, M2에서 신경활동의 기록에서는 S1과 비교하여 두 가지 피크가 아닌 한 가지 피크가 관찰되었다. 이 피크는 S1에서 관찰된 조발성 신경활동과 지발성 신경활동의 사이에서 발견되었다. ([그림 2C]) 또한 막전위 이미징으로 M2의 활동을 약으로 억제하면 S1의 지발성 신경활동이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2D]) S1의 조발성 신경활동은 외인성 상향식 입력이며, M2에서 외인성 하향식 입력된다는 것은 막전위 이미징으로 표시되는 반향회로의 존재를 지지하는 결과로 보인다. 또한 전 6층 중 5층에서 자발성 신경활동이 특히 활발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2E]) 이는 수지상 돌기가 다른 세포에서 정보를 수용하여 통합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전체 6층 중 가장 긴 수지상 돌기를 가진 5층 신경세포에서 보다 많은 정보를 긴 시간 동안 통합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연구진은 S1의 5층의 자발성 신경세포가 M2에서 외인성 하향식 입력으로 넘어가는 것을 해부학적 및 생리학적으로도 해명하였다. 이를 통해 5층의 지발성 신경활동에 대해 외인성 하향식 입력 단독이 종래 제창된 외인성 하향식 입력과 외인성 상향식 입력의 통합입력 ([그림 3A])과 같은 기능을 담당함을 알게 되었다. 그 결과 피부감각이을 지각하는 종래의 신경회로 모델과는 다른 새로운 신경회로 모델을 개발하였다. ([그림 3B])
![[그림 3] 종래의 지각 모델과 새로운 모델의 차이](//www.mdon.co.kr/data/photos/20150522/art_1432809500.jpg)
또한 연구진은 광유전학 수법에 의해 M2에서 S1로의 외인성 하향식 입력으로 특이적으로 제어하여 마우스 피부감각을 지각하는 외인성 하향식 입력의 역할을 조사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마우스에게 피부감각의 증거라고 할 수 있는 2종류의 바닥을 식별하는 행동과제를 부여하였다. 첫 번째 과제에서는 사각의 관 안에 사포(까끌까끌한 성질)와 뒤집은 면(미끌미끌한 성질)을 반반씩 깔고 그 안에 마우스를 넣었다. 마우스의 뇌에는 소형 광자극장치를 설치하여 외인성 하향식 입력을 광자극으로 억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4 AB]) 마우스는 까끌까끌, 미끌미끌한 바닥 모두에대해 한 쪽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광 자극을 하지 않는 마우스는 까끌까끌 혹은 미끌미끌한 바닥 어느 한 쪽에 편향되지 않았다. 하지만 광자극을 한 마우스의 경우에는 그 편향이 감소되었다. ([그림 4C]) 2개의 과제에서는 Y자 미로의 분기점의 바로 앞에 까끌까끌 혹은 미끌미끌한 바닥을 제시하고, 까끌까끌에서 왼쪽, 미끌미끌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훈련을 하여 광자극의 유무가 정답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그림 4D]) 광자극을 하지 않은 마우스는 약 80%의 정답률을 보이는 반면, 광자극을 한 마우스는 정답률이 65%까지 감소하였다. ([그림 4E]) 이상에서 M2에서 S1까지의 외인성 톱다운 입력이 정상적인 피부감각의 지각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진은 정상적인 피부감각 지각에는 S1에서 외인성 상향식 입력뿐만 아니라 그 후 M2에서 S1으로 외인성 하향식 입력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번에 발견한 신경회로가 종래의 회로와 달리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지각할 수 있는 회로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뇌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신경회로의 상태로 나뉠 수도 있다. 신경과학자들에게 현재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지각 등의 ‘주관적 체험’을 신경활동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본 연구결과는 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뇌졸중이나 사고에 의한 뇌손상이 생체감각뿐만 아니라 고차 영역에서 만들어지는 경우에도 실인이 일어나며, 본 연구결과는 그 메커니즘으로 뇌손상에 의한 고차 영역에서 S1의 외인성 하향식 입력을 하지 않게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향후 상세한 S1에서의 외인성 하향식 입력 메커니즘을 밝혀내는 것으로 실인의 개선 및 노령화에 따른 오감 지각능력의 저하 예방 및 개선 수단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Neuron지에 게재된 논문 "A Top-Down Cortical Circuit for Accurate Sensory Perception"에서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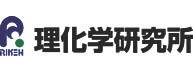

![[그림 2] S1와 M2에서의 마우스 뒷다리 자극시의 신경활동](http://www.mdon.co.kr/data/photos/20150522/art_1432809507.jpg)
![[그림 3] 종래의 지각 모델과 새로운 모델의 차이](http://www.mdon.co.kr/data/photos/20150522/art_1432809500.jpg)
![[그림 4] M2에서 S1로의 외인성 하향식 입력이 피부감각에 지각에 미치는 영향](http://www.mdon.co.kr/data/photos/20150522/art_1432809494.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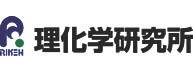

![[그림 2] S1와 M2에서의 마우스 뒷다리 자극시의 신경활동](http://www.mdon.co.kr/data/photos/20150522/art_1432809507.jpg)
![[그림 3] 종래의 지각 모델과 새로운 모델의 차이](http://www.mdon.co.kr/data/photos/20150522/art_1432809500.jpg)
![[그림 4] M2에서 S1로의 외인성 하향식 입력이 피부감각에 지각에 미치는 영향](http://www.mdon.co.kr/data/photos/20150522/art_1432809494.jpg)